서울시오페라단이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았다.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내 집무실에서 이건용 단장을 만나 30주년 의미를 물었다. ‘시작도 안 했다’는 인색한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시오페라단은 1985년 ‘서울시립오페라단’으로 창단했다. 그해 11월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셰니에’를 국내 초연했다. 이어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1989), 베르디의 ‘맥베드’(1997)를 국내에 처음 선뵀고, 창작 오페라 ‘시집가는 날’(1988)을 올리는 등 잰걸음을 이어왔다. 그러나 국내 오페라 저변이 열악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 단장의 30주년 평가에는 갈 길이 먼 국내 오페라계 현실이 반영돼 있다. 그는 서울시오페라단이 나갈 방향으로 서구의 극장 시스템을 꼽았다.
 |
| 이건용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은 “사람은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놀고 생각하고 별이나 달을 보며 한숨 짓는다. 별과 달을 보며 환상을 키운 인간에 의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며 “구체적 이익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인간적 본성이 있는데 오페라를 포함한 예술은 여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
그래도 30년은 기념할 만한 세월이다. 이 단장은 30주년의 이정표가 될 작품으로 구노의 ‘파우스트’(25∼28일)를 골랐다. 작품보다 연출자 존 듀를 먼저 섭외했다. “보여주기 식의 연출을 위한 연출이 아니라 작품의 원뜻을 제대로 보여주는 연출을 하는 사람이라” 함께 작업하고 싶었고, 상의 끝에 ‘파우스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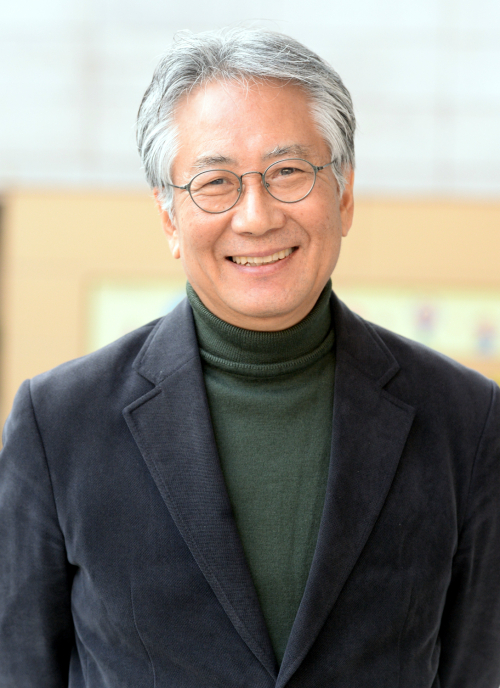
2012년 7월 5대 단장으로 취임한 그는 지난해 3년 임기로 연임됐다. 그는 서울시오페라단의 핵심을 ‘시민’과 ‘창작’으로 정했다. ‘시민’을 위해서는 2013년 8월부터 매달 한 번 ‘오페라 마티네’를 열고 있다. 3, 4시간짜리 오페라를 1시간 30분으로 압축해 올린다. 대부분 400석이 꽉 찬다. 창작을 위해선 ‘세종 카메라타’를 만들었다. 오페라 작곡가와 대본가가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다.
“‘오페라는 선악이 싸우는 면이 있어야 해요. 대본 분량도 희곡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압축적이어야 하죠. 그러니 오페라 작곡가는 언어를, 대본가는 음악을 알아야 해요. 양쪽이 모여 서로 공부한 뒤 숙제로 내놓은 작품이 지난해 11월 공연한 ‘달이 물로 걸어오듯’이에요. 내년 2월에는 ‘16번의 안녕’을 공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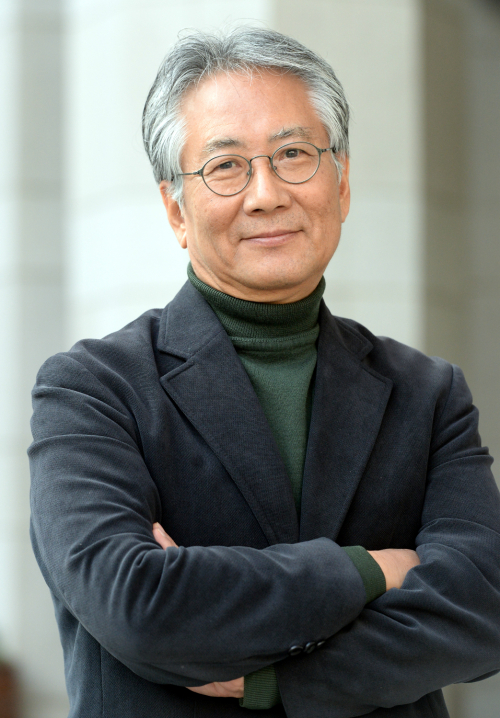
“20, 30년 전 ‘아제아제 바라아제’ ‘서편제’ 등의 영화가 나왔어요. 한국적 멋을 담았죠. 시간이 흘러 김기덕, 홍상수, 이창동이 외국에서 상을 받아요. 이들의 영화가 한국적인가요. 그렇다고 한국 영화가 아닌가요. 한국적 리얼리즘을 반영한 작업은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을 의식했다 봐요. 이제는 오리엔탈리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제기해야죠. 영화 ‘밀양’이나 ‘빈집’처럼요. 한국적 오페라라고 상투나 궁중 춤이 나오는 건 이제 구식이에요.”
이 단장은 1980년대부터 전통과 서양을 아우르는 음악을 고민하며 민족음악연구회를 만들었다. 그는 “80년대에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한국적인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꼭 한국적일 필요는 없잖아’로 문제 의식이 변했다”며 “우리의 발전 속도가 빨라서 한 세대 만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으니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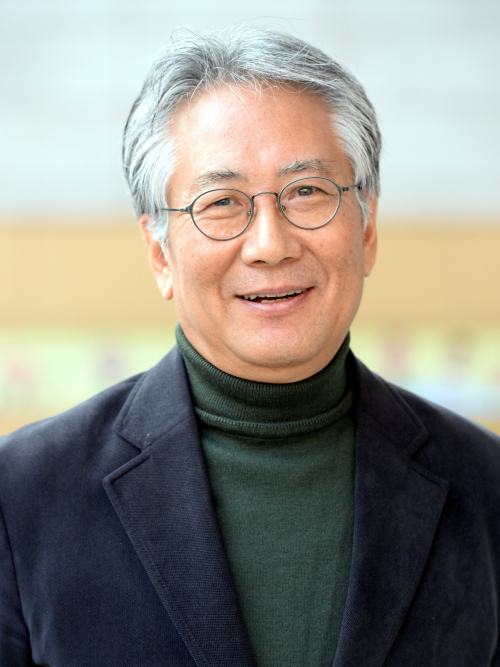
“1820년대 후반 조선의 수사관이 지하 교회를 일망타진하려 잠입하는 얘기예요. 당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보여주려 해요. 처음 생각한 건 30년 전쯤이에요.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5년, 대본을 쓴 건 3년 정도 됐어요. 그 시대에 내가 빚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열하일기’를 읽으며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의 책상 유리 아래에는 초창기 가톨릭 교도인 황사영이 쓴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암흑 속에서 청나라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쓴 글이다. 그는 “치열한 삶의 본보기라 두고 본다”고 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독일 대통령의 ‘케밥 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3/128/20240423518924.jpg
)
![[데스크의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27/128/20240227519474.jpg
)
![[오늘의시선] 22대 국회가 지구를 위해 해야 할 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29/128/20240229519542.jpg
)
![[안보윤의어느날]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3/128/2024021351556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