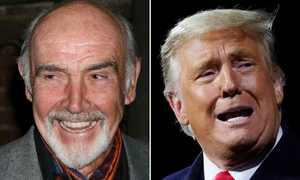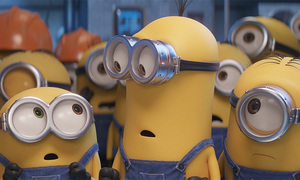투기 자본 진입 쉬워… 대기업 경영 걸림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1주당 선임할 이사 숫자만큼의 의결권 부여)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립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합산 3%룰)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법 제1차 개정안이 7월15일 공포된 이후 숨 돌릴 틈도 없이 제2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위험한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집중투표 의무화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라면 왜 일본은 1950년에 이를 의무화했다가 1974년 의무화를 폐지했겠는가. 미국은 1940년대 22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폐지하고 변변한 기업이 거의 없는 애리조나주, 네브래스카주 등 5개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의무화한 국가도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등 소수 국가뿐이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4개 기업(평균 이사 수 7.5명)을 대상으로 ‘합산 3%룰’과 집중투표를 결합한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이사 7명 중 1대 주주 몫은 2∼3명에 불과하고,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이사 수는 4∼5명에 달했다. 우선 감사위원인 이사 3명은 1대 주주 몫이 아니다. 왜냐면 2025년 상법 제1차 개정 때 도입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가진 모든 주식을 합하여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만약 2대 주주 이하의 주주들이 표를 결집해 집중투표에 나선다면 추가 2∼3명의 이사 자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박에 4∼5명의 이사 자리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한국 굴지의 H기업, K기업, L기업 등 여러 기업이 1·2대 주주 간, 형제간, 부자간, 모자간에 격심한 분쟁을 겪었으며, 그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집중투표 시행 이후에는 이들 기업에서 1대 주주의 의중이 반영된 이사들과 2대 주주 이하 연합 세력이 선출한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반드시 격돌하게 돼 있다. 상법 개정은 기업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부추긴다. 명확한 지휘체계가 생명인 기업 세계에서 이런 기업이 잘될 리가 있나.
한국 4대 그룹 주식은 외국인 보유가 50%를 넘는 곳도 있다. 외국인들이 이사 자리를 달라고 하면, 해당 기업은 이제 어찌해 볼 도리가 없게 된다. 2019년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의 경쟁사인 수소연료전지 기업 회장 로버트 랜들 매큐언을 현대차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그때는 현대차가 이해 상충 우려를 이유로 그의 임명을 거부했지만, 집중투표 하에서는 이런 사태가 생겨도 법률상 거부할 수 없다. 해외 투기자본이나 헤지펀드 등 특정 자본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회사의 영업비밀과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
심각한 문제는 독립성과 전문성 면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부적격 이사가 임명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커진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영입하기 위해 매년 수개월간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하며,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가 선임되는 것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차별이 되고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기업들은 회사 분할이나 자산 매각으로 기업 규모를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선택했던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들은 서둘러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상근 감사제도로 돌아갈 것이다.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으면 그 회사는 이미 내 회사가 아니게 된다. 미래 한국에 새 대기업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위험한 불장난, 당장 멈추어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서러운 이주노동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975.jpg
)
![[데스크의 눈] ‘갓비디아’가 된 엔비디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953.jpg
)
![[오늘의 시선] 위험한 실험 ‘집중투표 의무화’ 멈춰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938.jpg
)
![[안보윤의어느날] 생각과 다른 매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885.jpg
)